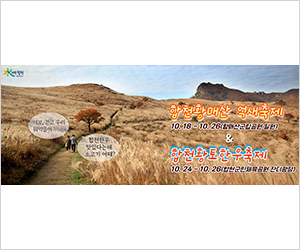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지시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출자금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1982년에 도입됐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지배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주사의 CVC 보유가 허용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4개사다. 이들은 전체 71개 투자조합을 통해 출자 약정액 기준 총 2조 368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포스코기술투자가 9676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CJ인베스트먼트(3973억 원), GS벤처스(1313억 원) 등이 뒤를 잇는다. 모든 CVC를 통틀어 개별 투자조합 규모가 대부분 수백억 원 단위로 크지 않다. 규모 1000억 원 이상 투자조합은 단 3개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현행법상 지주사가 CVC를 두려면 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여야 하고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비중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이나 그룹 계열사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제약이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정위 등에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허용 한도를 최소 50%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체 기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우선 외부 자금 확대 및 해외투자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펀드 조성 때 외부 자금 허용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 비율 역시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제도 설계를 구체화한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치며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 지주사의 투자 여력은 크게 확대된다. 당장 자회사 투자에 돈을 대기는 어렵지만 일단 펀드의 몸집을 키워놓으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마련하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같은 신기술 분야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카카오·네이버 사례를 보면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으므로 중소 기술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CVC 규제 완화 시 대기업의 위탁운용사(GP)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외부 자금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는 경우 모회사뿐만 아니라 외부투자자(LP)의 자금 유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지며 CVC의 GP 역할 수행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터 준다면 글로벌 AI와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지주사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체 대형 사업 투자는 여전히 한계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prize_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