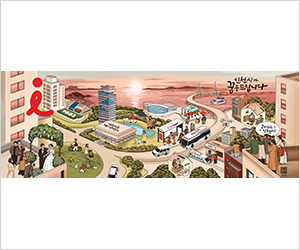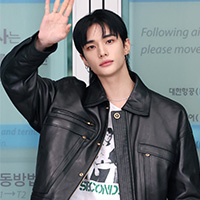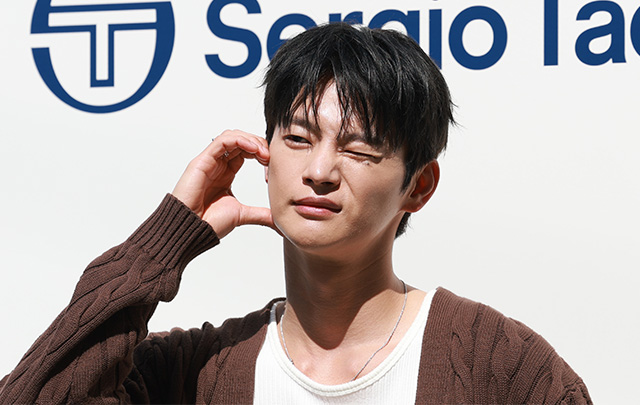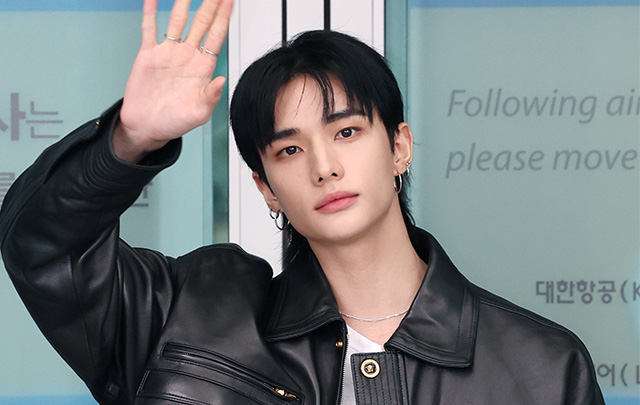“행시의 꽃인 재경직의 픽은 이제 기재부가 아니라 공정위다.” 세종 관가에선 최근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2023년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과 법무행정직 수석, 2024년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이 첫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택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에너지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흡수되면서 기능을 떼어낸 데다, 기재부마저 조직이 쪼개지면서 경제 부처 가운데 공정위만 홀로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3년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인 정서윤 사무관과 2024년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인 홍서진 사무관이 이번 주부터 공정위에서 실무 수습을 시작했다. 정 사무관은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에서, 홍 사무관은 입찰담합조사과에서 각각 근무를 시작했다. 특히 2024년 행시 재경직 차석을 거머진 홍 사무관은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간호사로 일하다 주경야독 끝에 고시에 합격한 이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시는 2~3년 준비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합격하고 공정위에 지원해서 내부적으로 관심이 크고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행시 법무행정직 수석 합격자인 박진재 사무관도 공정위를 선택하면서 공정위의 인기를 세종 관가에서 실감하는 분위기다. 박 사무관은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에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까지 갖췄는데도 공정위에 오고 싶어 행정고시에 응시했다.
그동안 관례대로라면 행시 재경직 수석·차석은 기획재정부 입성이 정석이었다. 예산·세제 등 핵심 경제정책을 다루며 ‘경제부처의 꽃’으로 불려온 기재부의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수석·차석 합격자를 비롯해 성적 상위권에서 연이어 공정위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다. 특히 25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 이관이 무산되면서 기재부의 인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재경부의 경우 예산 조직도 분리되는 데다 국내 금융마저 이관되지 못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기재부는 업무 과중과 국회의 자료 요구 등으로 밤늦게까지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아 젊은 MZ 사무관들 사이에서 이른바 ‘워라밸’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 젊은 사무관의 이탈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020~2024년 기재부 퇴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를 떠난 10년 차 이하 사무관만 8명이다. 시기별로 △2020년 1명 △2021년 3명 △2022년 2명 △2023년 3명 등이 퇴사했는데 대부분 로스쿨, CPA(공인회계사), 민간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
반면 공정위의 위상은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정거래 조사인력 150명 증원이 반영되었다. 통상 진보 정부에서 공정위 파워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2020년~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시 재경직과 법무행정직 수석이 잇따라 처음으로 첫 부처로 공정위를 택했다. 당시 행시 64회 재경직 수석인 김영찬 사무관과 법무행정직 수석인 최유경 사무관 등이 공정위를 지원해 공정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 후 재취업도 유리해 실속형 부처로 꼽힌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으로 준법·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주목받는 것도 공정위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기에다 퇴근 시간도 비교적 일정한데다, 개인이 사건을 맡아 책임지고 처리하는 구조 덕분에 개별 성향과 판단을 존중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도 자리잡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최근 젊은 MZ 세대 사무관들 사이에서 ‘세종의 구글’로 불리고 있다.
올해 새로 배치된 5급 수습사무관 9명 전원이 성적 상위권이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세종 관가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퇴직 후에도 민간 기업이나 로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연금개시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인기는 갈수록 커질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고시 수석과 차석이 기재부 대신 공정위를 선택하는 일이 가속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prize_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