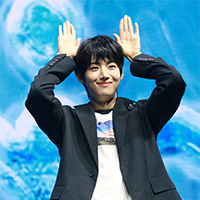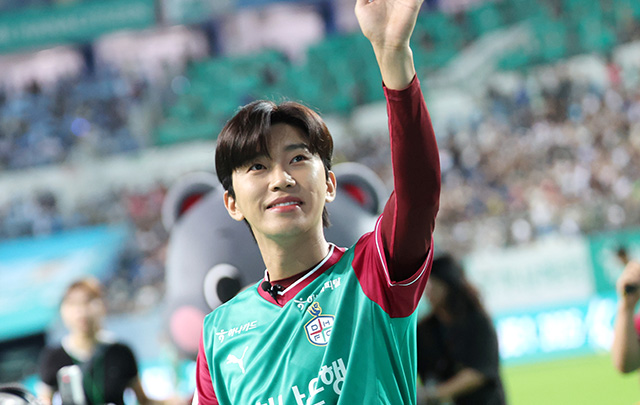미국 자산운용사 아카디언의 오웬 라몬트 수석 부사장이 처음 사용한 ‘코리아파잉(Koreafying)’은 “한국 증시에서 관찰됐던 여러 가지 부정적 모습들이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최근 미국에선 정치 테마주가 등장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국내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반대 여론이 확산 중이다.
그가 지적하는 한국 테마주의 특징은 대략 세 가지다. △기업의 본질 가치와 전혀 무관한 테마를 기반으로 한 주가 결정 △특정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 △ 단체 투기와 음모론, 공매도 혐오가 뒤섞인 투자 문화 등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기업의 실제 가치나 성장성과 주가의 괴리가 커지고, 그 결과로 증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웬 부사장은 해당 비판과 함께 “K-POP, K-드라마, K-영화 등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K-주식시장은 거절합니다”라며 우리에게는 다소 부끄러운 표현을 덧붙였다. 높아진 한국의 경제, 문화적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리 증시의 투자 문화가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올해 7~8월 코스피 지수가 횡보세를 보이면서 다시 확산했던 비관론 역시 고질적인 코리아파잉 현상 중 하나다. 순간적으로 정부 정책이 혼선을 겪고 단기 상승 추진력이 약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 증시는 여전히 크게 저평가돼 있고 정부 정책의 장기 기조가 변함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경제나 증시의 여러 구조적 원인 탓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서구권 증시 대비 현저히 낮은 기관 투자가 비중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들은 단기 고수익을 위주로 쏠리는 경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는 원래 10% 수준에 머물던 개인 거래 비중이 코로나 이후 20%대로 높아지면서 ‘코리아파잉’ 현상이 동반됐는데 우리 증시의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전통적으로 50%를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시장 제도나 주주권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본 시장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투자 문화도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크게 위축돼 있는 기관의 역할 증대가 절실하다. 기관 투자의 순기능은 ‘증시 양질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점이다. 기관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밸류에이션, 가격 이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균형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증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제는 국내 증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식형 펀드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nough@sedaily.com
enoug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