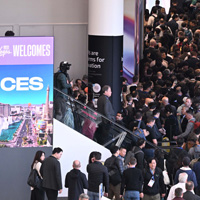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세부 내용을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형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3기에서 2기로 줄고 계속운전 허가 기간 확대가 사실상 무산되자 원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붕괴됐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원전 계획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이 축소될 경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로 불붙은 원전 수출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형 원전 1기 신규 건설을 취소하면 나머지 2기의 건설 비용이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원자력발전소는 한 부지에 5~6기를 설치하는 데다 주요 설비 대부분이 주문 제작 방식이어서 신규 건설 계획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원전 건설은 십수 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계획 변동이 잦을수록 관련 업체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 건설 계획을 줄이고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 또한 나왔다. 노동석 한국에너지문화재단 원전소통센터장은 “11차 전기본 초안대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리는 것도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대형 원전 1개분 설비를 태양광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11차 전기본 초안의 전력수요 예측 역시 상당히 보수적으로 측정된 것이어서 원전 신규 건설 없이는 원활한 전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변동될 경우 원전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공식화하면서 원전 수출이 멈췄었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뒷걸음질 치면 원전 세일즈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국·루마니아·이탈리아 원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