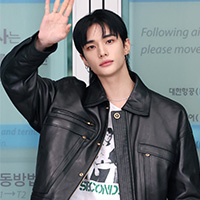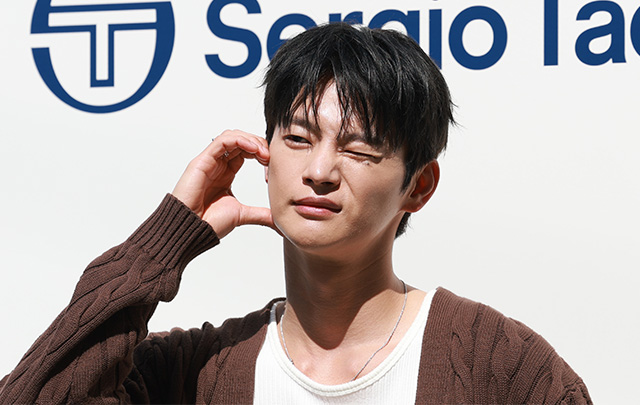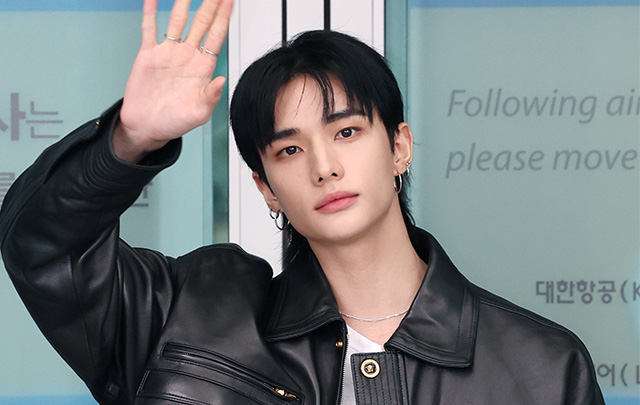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하면서 공항 면세점의 존속 여부가 도마에 올랐지만, 업계가 직면한 더 큰 위기는 시내 면세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출 비중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시내점이 팬데믹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업계 전체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논란에 가려졌지만 시내점 추락이 장기화되면 면세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가 인천공항 DF1 사업 철수를 발표한 데 이어, 신세계(004170) 역시 DF2 철수 가능성이 점쳐지며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면세점협회 통계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7월 기준 전체 면세점 매출 9199억 원 가운데 시내점은 6452억 원으로 비중이 70.1%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항 출국장 매출은 2307억 원으로 25.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시내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8% 줄어든 반면, 공항 출국장은 오히려 19.7% 증가했다. 업계의 주된 위기는 임대료가 아니라 시내점의 부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낙폭은 더 크다. 지난해 시내점 매출은 11조 3239억 원으로 2019년 21조 308억 원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불과 5년 만에 10조 원 가까운 매출이 사라진 것이다. 감소율은 46.1%에 이른다. 공항 출국장도 같은 기간 3조 2520억 원에서 2조 2767억 원으로 줄었지만, 충격 강도는 시내점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보따리상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등에서 쇼핑하는 경향이 늘면서 시내점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졌다고 분석한다.
관련기사
신라·신세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점별 구체적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점 실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공항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배경이 시내점 부진 보전을 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천공항과 정부가 냉담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가 기대를 거는 카드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정부는 29일부터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고, 주요 면세사들은 이를 반전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롯데는 서울 명동본점 면세점 특허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중국 광저우 CITS 여행사, 칭다오여유그룹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알리페이·위챗페이로 100달러 이상 결제 시 적립금을 제공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신라면세점은 중국 여행업계와 협력해 마이스(MICE)와 인센티브 단체 유치에 나섰고,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몰에서 할인 쿠폰과 추가 적립금 행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실적 회복이 지연된다면 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처럼 다른 시내점 철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 업계는 시내점이 무너지면 전체 수익 구조가 붕괴해 공항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시내점 회생 방안을 찾는 게 업계 전체의 생존을 좌우할 과제”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oud@sedaily.com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