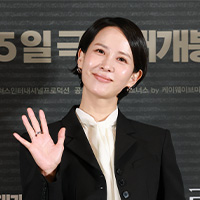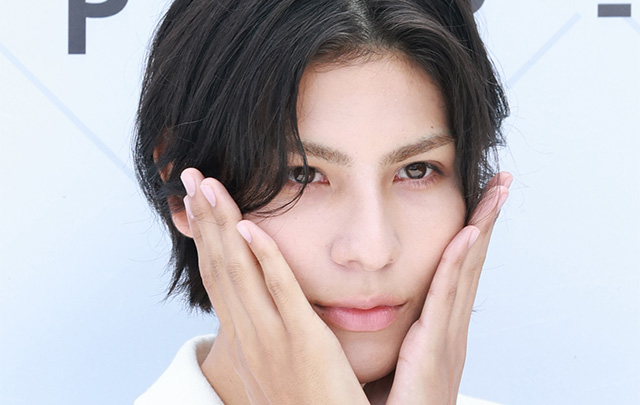5대 시중은행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국제 금융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규제와 연체율을 고려하면 건전성 유지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외에 상생기금 출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인상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윳돈 이전 등에서 보듯 은행에 재정 보조 역할까지 떠안기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대로라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락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8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최저치를 72.5%로 올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기준에 맞춰 현 수준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유지하려면 약 11조 9600억 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
한국 은행들은 이 규제에 따라 현행 60%인 내부등급법(은행 자체 방법론)상 RWA 최저치를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대출을 유지하면서 자본비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최소 12조 원가량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자·비이자(수수료) 이익 증가→당기순이익 확대→자본 확충’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예대마진은커녕 최소 조 단위의 추가 부담이 예정돼 있다. 당정이 예고한 △교육세 인상(1조 3000억 원) △보이스피싱 배상(피해액 1조 원) △배드뱅크 출자(4000억 원) △가산금리 산출 시 법정 비용 제외(3조 원) 등만 5조 7000억 원가량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은행에 단순히 상생을 요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금융권을 동원하고 세수 증가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며 “은행이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낸다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