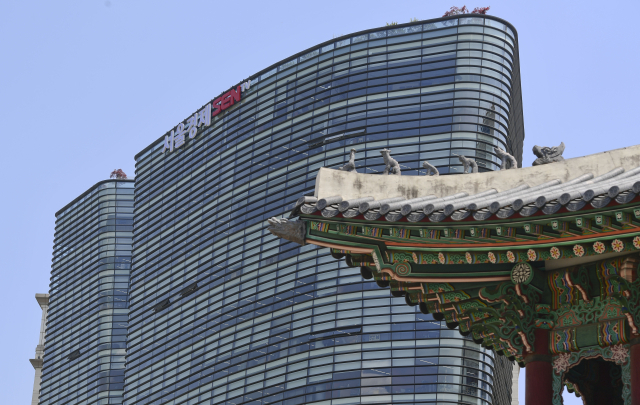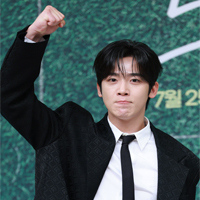2005년 12월 인도를 방문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반년도 지나지 않은 2006년 4월 다시 인도 출장길에 올랐다. 인도 금융 당국에 자산운용사 설립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였다. 신청서에 적은 투입 자본금은 약 500억 원. 당시 인도 현지 자산운용사 중 최대 규모였다. 홍콩과 싱가포르 다음으로 추가 해외 법인 설립 국가를 고심하던 박 회장은 성장 잠재력에 확신을 얻고 마음을 굳힌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은 ‘선(先)운용사 진출, 후(後)증권사 설립’이다. 1997년 미래에셋그룹 창립 당시 운용사를 먼저 세우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뒤 증권사를 설립한 전략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사업을 발판 삼아 성장을 거듭하던 중 박 회장의 승부사 기질이 발동하면서 지난해 현지 10위 증권사였던 ‘쉐어칸’을 인수해 명실상부 인도 대표 증권사로 자리매김했다. 박 회장의 평소 신념대로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처럼 국내 금융 기업도 ‘국부(國富)’ 증대에 기여하는 시대를 연 셈이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2~3년 뒤면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그룹의 인도 시장 개척에는 ‘기회의 땅’ 인도에 앞서 진출한 국내 대기업이 큰 힘이 됐다. LG전자 인도법인은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고공 행진하고 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생활가전 사업 부문에서 펼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인도 중산층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인도법인 기업공개(IPO)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스마트폰과 TV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며 순항 중이며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완성차 업체 가운데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현지 관계자는 “고령화와 저성장은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라며 “전 세계 국가 중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인도가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nough@sedaily.com
enoug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