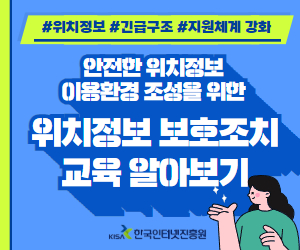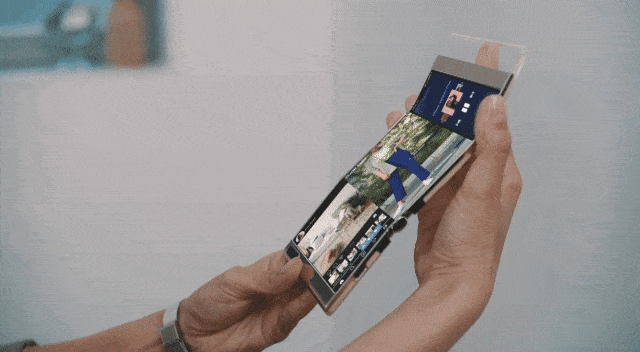‘값싸고 효과 좋은 약’으로 알려진 제네릭(복제약)이 의료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는 필수 치료 수단으로 떠오르면서다. 하지만 제약사 간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특허 분쟁도 함께 격화되며 제네릭의 빠른 확산이 곧 특허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연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둘러싼 분쟁이 집중되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이 대표적이다. 이 약물을 놓고 80여 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1·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원개발사인 HK이노엔(195940)은 물질특허를 바탕으로 방어에 나섰다. 올해 2월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에는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뇨병 치료제인 LG화학(051910)의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역시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3년부터 제미글로의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후 권리범위확인 항소심에서는 LG화학이 승소한 뒤 제네릭사들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무효 심판 항소심은 내달 21일 특허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를 둘러싼 특허 분쟁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부터 총 6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가운데 일부 특허에 대해 원개발사 노바티스가 항소했지만 용도특허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현재는 결정형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상고심에 계류돼 있으며 업계는 이르면 연내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허 분쟁은 단일 품목을 넘어 제약사의 중장기 전략과 제네릭 진입 시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나의 약물에 복수의 특허가 중첩된 경우 일부 특허가 무효화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 진입이 활발해지는 만큼 이 같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향후 특허 소송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선 특허 소송이라는 불확실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특허 한 건에 따라 수천억 원대 매출과 출시 시점이 수년씩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yj@sedaily.com
sy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