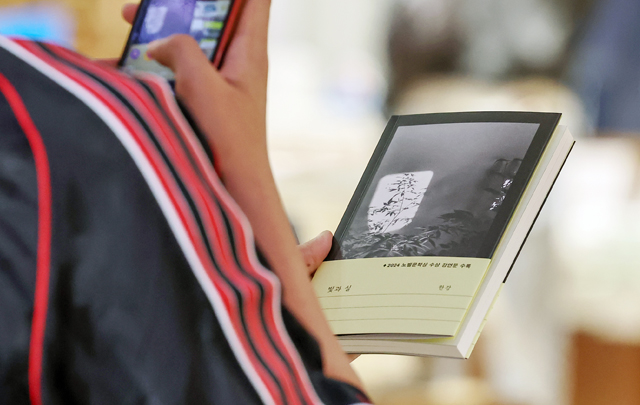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조선업계가 중국에 완전히 밀렸던 컨테이너선 시장까지 되찾아오며 올 들어 신규 수주만 13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대만 해운 업체가 발주한 3조 45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4척까지 최근 수주하거나 계약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삼호는 25일 대만 해운 업체인 완하이라인과 5596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만 완하이는 삼성중공업(010140)에도 동일 컨테이너선 2척을 같은 가격으로 발주해 수주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HD현대삼호의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을 비롯해 한화오션(042660)과 삼성중공업은 또 다른 대만 해운사인 양밍이 발주한 2조 3400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0척 건조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밍은 8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중유 컨테이너선 3척과 1만 5000TEU급 액화천연가스(LNG) 컨테이너선 7척에 대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난해 세계 컨테이너선 점유율이 86.6%에 달했던 중국 업체들이 불참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유력해졌다.
실제 지난해 컨테이너선 점유율이 11%에 그쳤던 국내 조선 업계는 올 1분기 점유율이 30%까지 치솟으며 중국 업체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010620)는 그리스 해운사인 캐피털마리타임과 각각 컨테이너선 6척(1조 2200억 원)과 14척(1조 310억 원)의 건조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이며 한화오션은 독일 해운사인 하파그로이드로부터 1만 6800TEU급 컨테이너선 6척(1조 8000억 원) 수주를 눈앞에 뒀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2조 3000억 원에 수주했다.
매번 값싼 입찰가를 써내며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를 싹쓸이하던 중국 조선사들의 기세가 꺾인 것은 미국발 해양 전쟁 탓이다.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중국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적과 기업에 상관없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매기기로 결정해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향 컨테이너선 수주를 회피하는 추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약 7만 원)의 입항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나라 기업이라도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면 톤당 18달러 혹은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180일 후인 10월 14일부터 부과되며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됐음에도 꾸준히 무역 관계를 다져온 중국이 이례적으로 양밍의 대형 컨테이너선 입찰에 불참한 것 역시 이 같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에 ‘해운전쟁’을 선포한 셈이어서 중국산 선박 기피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값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 컨테이너선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글로벌 선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을 운용할 경우 해운사의 원가 부담이 최대 1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외 선사가 중국산 선박으로 미국에 입항하는 경우 척당 20억 원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 주도의 선박 금융지원을 토대로 글로벌 선사들의 발주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글로벌 1~5위 해운사의 중국산 선박 비중은 20~30%에 육박한다. 프랑스 국적의 3위 해운사 CMA-CGM의 중국산 선박 비중이 41%로 가장 높으며 1위 해운사인 MSC(24%)와 2위 머스크(20%), 5위 하파그로이드(21%)도 20%가 넘는다.
선사들이 건조를 진행 중인 발주 잔액도 중국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MSC의 발주 잔액 내 중국 비중은 97%다.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89%, 머스크 59%, ONE 58%, CMA-CGM 47%, 에버그린 36%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많은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가격 매력은 완전 사라졌다. 수수료 부담을 우려한 글로벌 선사들은 한국 조선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HD현대삼호는 이날 아시아 선사로부터 5596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 해당 선사는 대만의 완하이라인으로 2척 모두 고부가 메탄올 DF 컨테이너선이다. 삼성중공업과도 같은 기종으로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 역시 독일 해운사 하파그로이드로부터 1만 68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수주를 목전에 뒀다. 총 계약 규모는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화오션은 미국 제재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에도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으로부터 2만 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1척당 가격은 3881억 원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준 역대 최고가다. HD한국조선해양도 1월 CMA-CGM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3조 7160억 원에 따냈다.
이 같은 ‘수주 러시’에 따라 우리나라의 컨테이너선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31.9%에 달했던 점유율은 지난해 11.4%까지 축소됐으나 올해 29.7%(23일 기준)로 다시 올라왔다. 지난해 86.6%에 달했던 중국의 점유율은 현재 58.1%까지 낮아진 상태다.
증권가 등에서는 중소형 컨테이너선 분야도 한국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선보다 중소형선의 중국 발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중소형선이 글로벌 선사들의 전체 선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대형선(33%)보다 높다. 발주 잔액 비중 역시 68%로 대형선 58%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운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황을 관망 중인 글로벌 선사들은 여전히 중국 조선소에 발주 물량을 맡기고 있지만 위험을 분산하려는 일부 선주들은 선제적으로 한국과 일본 조선사를 찾고 있다”며 “미국의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선박 계약이 인도시 대부분의 자금을 납입하는 ‘헤비테일’이라 계약을 파기하고 물량을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발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선 업계가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선사들이 중국 야드를 기피할 유인이 커져 선가가 낮은 선종들이 다량 발주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부가 수주 잔액이 많은 국내 도크에서는 건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조선사들은 원가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나 전략적으로 진출한 미국 조선사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건조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t@sedaily.com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