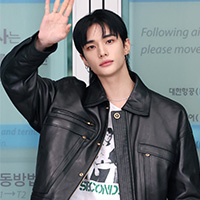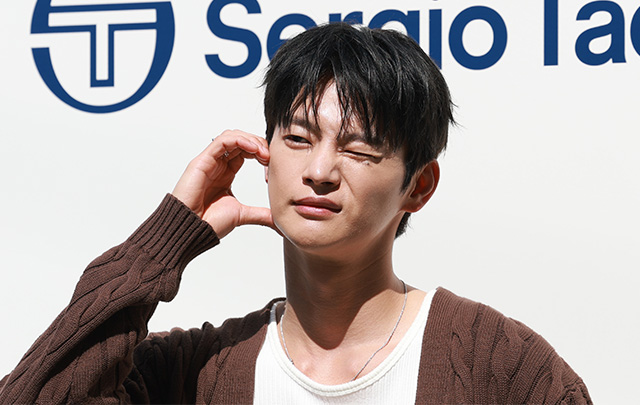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직접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 모집 전 신고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조합과 조합장 B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조합은 민간임대건설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투자 약정을 맺고 2020년 7월 설립됐다. B씨는 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문제는 B씨가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조합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투자하되, 실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체결할 예정이었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조합과 B씨를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직접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30호 이상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사전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조합에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조합의 법인 등기부상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업방법과 무관하게 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급’은 단순한 형식적 임대차계약 체결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 임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