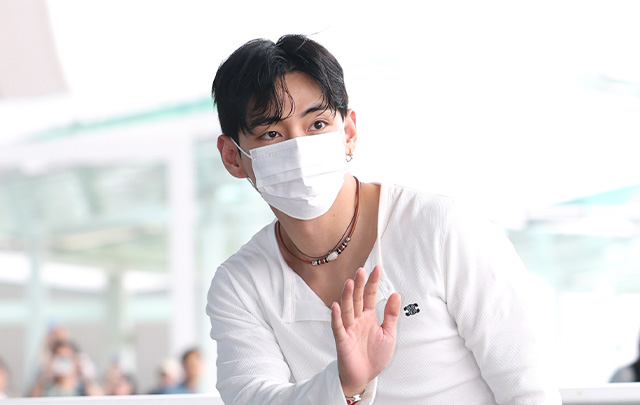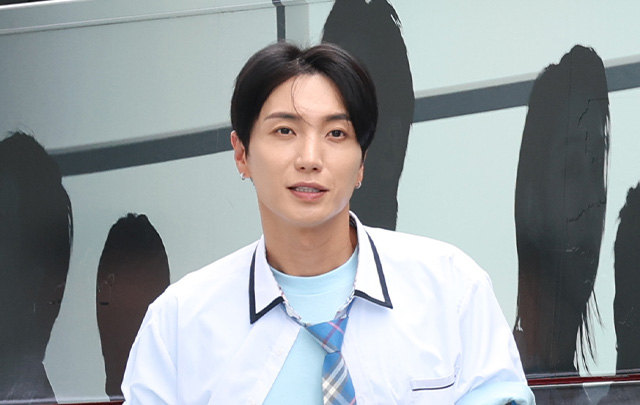한국 미술에서 추상을 말하면 대다수가 ‘단색조’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깊은 색감과 고요한 평면, 수행에 가까운 반복 행위로 완성한 명상적인 세계.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한국 추상의 전부일까.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지난달 19일 막을 올린 ‘도상(途上)의 추상’은 이처럼 익숙해진 한국 추상의 문법에 과감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다. 제목이 말하듯 전시장에 모인 작품들은 어떤 숭고함을 말하기보다 길 위에서 벌어진 세속적인 사건과 감정들을 주로 다룬다. 한국 단색화가 명상적 수행과 정신적 초월에 매달렸다면 이들 작가가 표현하는 것은 현실의 한복판으로 내려온 추상인 셈이다.
전시는 17명 작가들의 개별적인 탐색을 통해 ‘세속의 추상’이라는 주제를 다층적으로 구현한다. 김서울·김아라·박경률·박미나·박정혜·송은주·심우현·심혜린·안종대·양자주·이은경·이창원·이희준·조경재·조재영·차승언·최영빈 등 작가의 인장이 선명한 대표작 180여 점이 미술관에 모였다. 고요함 대신 생동감이, 초월적 관조 대신 번뇌와 욕망이 가득한 작품이 대다수다. 또 상황과 형태의 묘사가 뚜렷해 ‘이것도 추상인가’ 싶은 작품도 많다. 김태서 학예연구사는 “100% 추상 회화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며 “이번 전시는 구상과 추상 사이의 다양한 지점들을 포착하려고 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상 미술은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근본적 탐구에 가깝다”며 “추상에 대한 단편적 시각을 벗어나 동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빨강, 초록, 파랑 등 원색으로 그은 구불구불한 선과 낙서하듯 휘갈긴 붓의 터치가 내뿜는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심우현은 고대 신화나 구전 설화 속에 담긴 정념의 흔적을 회화로 표현한다고 작품을 설명한다. 심혜린도 밑그림 없이 직관적으로 붓을 긋는 회화를 통해 인간 내면의 갈등이 충돌하는 긴장감을 전달하는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작가는 ‘이 점으로 붕괴!’라는 대형 작품에 대해 “기술은 진화하지만 오히려 타자와의 연결을 잃어가는 어떤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로 9~10m의 대형 회화와 대규모 설치 작품도 여럿 전시돼 눈길을 끈다. 박경률의 ‘생활’은 붓을 든 자신의 신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캔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색채의 붓질을 통해 불분명한 형태를 힘 있게 그려내며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사유와 감각의 파편을 담아낸 작품이다. 도시의 기하학적 질서를 사진 콜라주와 아크릴 회화로 재구성한 이희준 작가의 9m 대작 ‘식(蝕): 겹쳐진 시간, 펼쳐진 공간’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장은 “‘보이는 것 너머’는 언제나 ‘보이는 세계’와 밀착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정신(비물질)과 물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실에 발 붙인 추상 미술을 통해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선 진리를 감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9월 14일까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