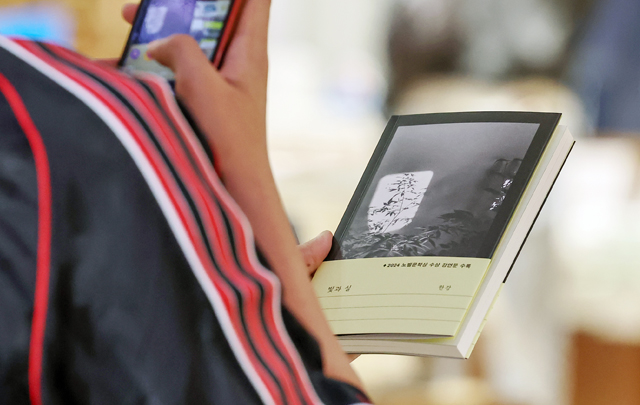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 후 금융시장에서 나타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현상은 이례적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올 들어 10% 빠진 것은 둘째 치더라도 미국 국채와 달러 시장에서 나타난 전방위 투매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신호다. 골드만삭스는 1973년 이후 발생한 여러 증시 급락기 가운데 초반부터 달러가 함께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의 강도를 낮춘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이달 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최대 49%까지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10%로 낮추기로 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등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사실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점도 상당한 변화로 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자산의 투매 현상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 혼란은 관세전쟁의 임계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율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다.
무역과 외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은 미국이 중국과 동맹국에 속고 있다는 서사다. 상호관세 부과 당시 그가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훔쳤고 외국 사기꾼들이 우리 공장을 약탈했으며 외국의 기회주의자(scavengers)들이 미국의 꿈을 조각내버렸다”고 말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과 동맹국들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모조리 뺏고 자신들은 미국에 수출하면서 정작 미국산 제품은 여러 장벽을 세워 팔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인식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서사와는 다르다. 학계는 통상 해외 각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달러의 글로벌 유동성이 유지되고 이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본다. 또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와 달러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능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약탈 서사’는 여전하다. 그는 14일 “어떤 나라도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비관세 장벽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17일에도 “일본 협상단이 ‘무역 공정성’을 위해 온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관세 리스크는 줄지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관세 목표는 그대로 둔 채 국채가 요동치지 않는 선에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테면 주요국에 대한 관세 발효 유예 기간을 연장해 금융시장의 일시적 혼란을 피하는 식이다. 시장이나 상대국 입장에서는 결국 부과될 관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지는 셈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공급망 조정이나 투자 계획을 더 미루게 된다. 조기 관세 면제와 같은 전향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미국과 상대국 모두 점점 침체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미국이 침체에 빠지게 되면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일궈내더라도 불황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최근 “우리는 목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럽·영국·일본·한국·호주·필리핀과 견고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약탈 서사로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우회적 충고다. 우리가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신호 역시 미국 국채 시장이 혼란할 때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 서사를 버리고 ‘동맹국의 기여’를 언급할 때일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ok@sedaily.com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