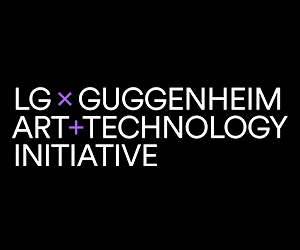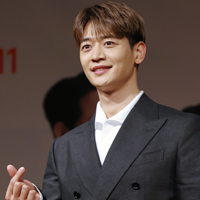“정치인 사건은 차라리 국민투표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사석에서 가끔 농담처럼 뱉는 말이라고 했지만 이 말 한마디로 판사들이 정치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판사들은 각 사건마다 부담감을 느낀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더욱 그렇다. 유명 국회의원의 사건을 배정받은 적이 있었던 한 고법 판사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사들이 정치인 사건에 부담을 가지는 큰 배경에는 정치권의 판사 공격 문화가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자신들이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여론 공격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에게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제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마치 법원이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각자의 진영으로 분열된 국민은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46.1%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민의 법원 신뢰도가 50%를 넘은 경우는 2021년(51.3%)에 단 한 번뿐이었다.
판결은 법의 조문과 판례를 통해 이뤄진다.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법정 내에서 이뤄진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3인 합의 재판부의 경우 판사들끼리 끊임없이 의견을 나눈다. 이를 두고 한 지법의 부장판사는 “판사는 생긴 대로 쓴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은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법원의 판단에 과도한 압박을 주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법 앞에 선 모든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4our@sedaily.com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