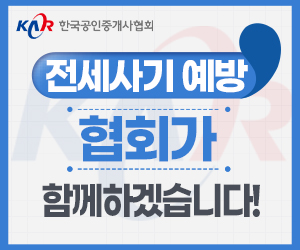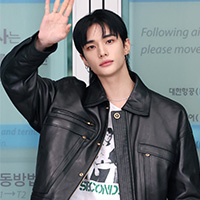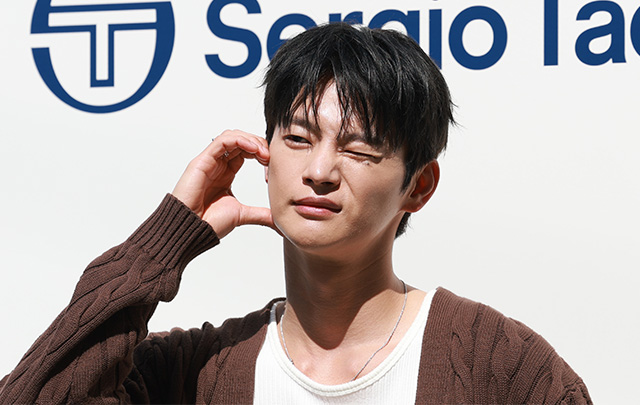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인근에 자리한 컴퓨터 역사 박물관은 ‘테크 덕후’들의 성지로 불린다. 17세기 파스칼·라이프니츠가 발명한 톱니바퀴 기계식 계산기부터 건물 한 층을 가득 채우던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 PC의 시대를 연 애플1 등 ‘유물급’ 전시품을 만날 수 있다. 1904년 등장한 진공관이 오늘날 손톱보다 작은 칩셋 속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이 차오르곤 한다.
전시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경외감은 묘한 공포심으로 바뀐다. 시대순으로 배치된 전시물 초기 절반은 IBM이 도맡았다. 인구조사를 위한 천공 카드 기계부터 기업·기관 전산화를 주도했던 메인프레임, IBM이 최초 발명한 D램과 하드디스크가 빼곡하다. 1980년대부터는 IBM의 존재감이 옅어진다. 대신 인텔이 그 자리를 채운다. 1940~1970년대는 IBM이, 1980~2010년대에는 인텔이 컴퓨터를 의미했다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
현재 두 기업의 위상을 떠올리면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한때 기술 세계를 지배하던 두 기업의 시대도 30년을 채우는데 그쳤다. IBM은 빅테크로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텔은 20년 전 인수를 고려했던 엔비디아를 ‘주주님’으로 모시게 됐다. 컴퓨터 역사 박물관과 인근 구글 사옥이 ‘3D 그래픽 원조’인 실리콘그래픽스(SGI) 본사 부지였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격세지감이 밀려든다. 한때 실리콘그래픽스는 ‘컴퓨터그래픽(CG)’ 그 자체였다. ‘터미네이터2’ ‘쥬라기공원’ ‘토이스토리’ 등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여준 영화들이 모두 실리콘그래픽스 기술로 탄생했다. 이제 3D 그래픽을 거론할 때 실리콘그래픽스를 떠올리는 이는 없다. 회사는 2009년 파산해 이름조차 기억하는 이가 드물다. 역사 속에 남은 회사 건물에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 들어섰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IBM과 실리콘그래픽스·인텔의 실패에는 모두 ‘공급자 중심 사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PC 시대가 열리던 때로 돌아가보자. IBM은 PC 표준을 공개해 놓고도 주력 사업이던 메인프레임에 집착했다. PC를 개인용 장난감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IBM이 만들어놓은 ‘장난감’으로 성장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이다. IBM은 뒤늦게 PS/2로 PC 시장 재진입을 노렸으나 폐쇄적인 독자 규격으로 외면 받았고 결국 1990년대 파산 위기를 겪으며 주류에서 밀려난다.
실리콘그래픽스도 같은 길을 걸었다. 누구나 PC에 그래픽처리장치(GPU)만 꽂으면 3D 그래픽을 즐길 수 있게 된 시대가 왔으나 독자 운영체제(OS)와 GPU를 묶어 파는 기업용 고가 워크스테이션을 고집했다. 이 틈을 비집고 단일 GPU만 판매해 3D 그래픽 시장을 장악한 회사가 엔비디아와 훗날 AMD에 인수된 ATI다.
인텔은 10년 전만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했다. 경쟁사 AMD가 사라지면 독점기업으로 분할될까 두려워 제품 개발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급기야 인텔은 10㎚ 이하 초미세공정 진입을 포기하고 제품 개선을 등한시했다. 뒤늦게 TSMC와 공정 격차를 따라잡으려 했으나 역부족이다. 남은 것은 위태로운 CPU 헤게모니와 텅 빈 파운드리, 그리고 심각한 재정난이다.
“우리가 표준이다” “우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자만에 빠져 마케팅의 기본인 소비자 니즈를 등한시하고 눈앞의 수익만 좇은 대가다. 그렇게 노키아가 애플과 삼성전자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구글 크롬에, 마이스페이스와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에 1위 자리를 뺏겨 다시는 복귀하지 못했다. 뒤늦게 절치부심해도 늦다. 기업사에서 한 번 잃은 1위 자리를 다시 찾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안방 호랑이’ 자리에 취해 모두가 반대하는 업데이트를 강행한 카카오가 새길 말이다. 다음이 e메일 유료화로 1위 포털 자리를 내준 역사를 돌아볼 때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herenow@sedaily.com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