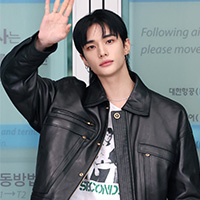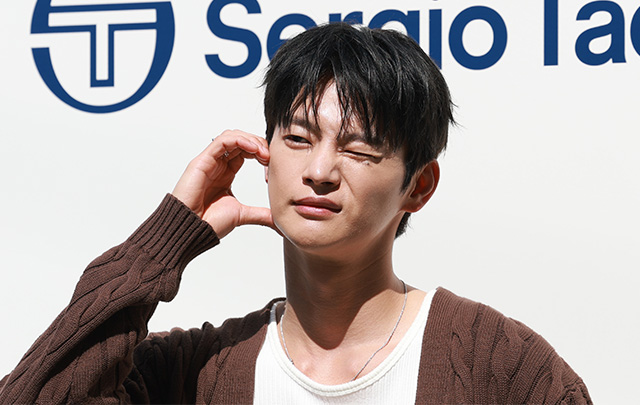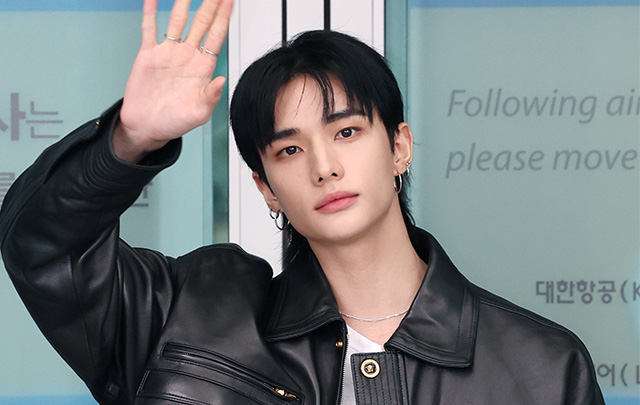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희망퇴직 실시가 급증하고 있다. 50대 직장인의 조기 퇴직이 보편화된 가운데, 정년을 채운 60대도 생계 유지를 위해 재취업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이나 낮은 연금액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마저 마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통계청의 25일 '2023년 국민이전계정' 발표 자료를 보면, 국민 개인의 경제활동은 45세 정점을 기록한 뒤 61세부터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45세 연소득은 4433만원으로 최고치를 보이며 흑자액도 1748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61세 이후부터는 연령 증가에 비례해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축소와 의료비 지출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 수지 구조를 살펴보면, 0~27세 구간에서는 교육비 지출로 적자가 지속된다.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16세의 적자 규모는 4418만원으로 전 연령 중 최대 수준이다.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는 28세부터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며 흑자 기조로 돌아선다. 흑자 전환 시기는 2010년 이후 2728세 구간에서 안정적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적자 재전환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5년간 늦춰졌는데, 이는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심각한 문제는 60~64세 연령층 과반수가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소득 절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수급자라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3년 연금통계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에 그쳐 최소 생계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 실패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급액은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65세 이후에도 생존을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청년층 취업난 심화로 30대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중장년층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60대는 각종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시기로, 가족 내 환자 발생 시 의료비가 가계를 더욱 옥죄는 요인이 된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치료제 사용 시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61세 이후 적자 구조 진입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되, 무엇보다 건강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고령기 근로 지속 가능성은 결국 건강 상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sunsh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