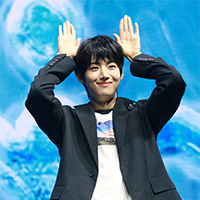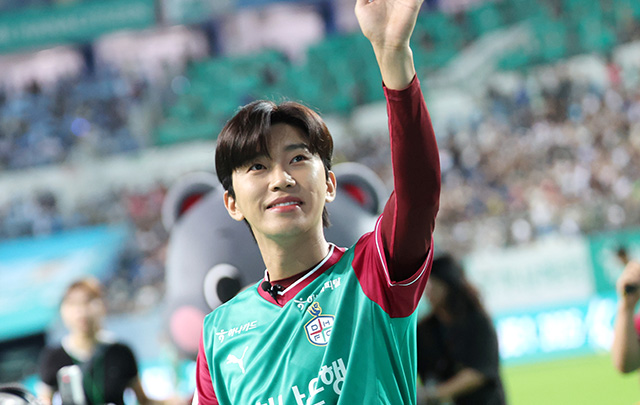아프가니스탄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40㎞ 직선거리에 있는 도시 바그람 일대에 공군기지를 세웠다. 1979년 아프간 내 반소련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침공한 소련은 이 기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약 10년 후 소련군이 패퇴하자 바그람기지는 이슬람 내전 세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1년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이 테러 배후 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바그람기지를 작전본부로 삼았다. 이후 미군마저 2021년 철군했고 바그람기지는 현지 탈레반 정권의 수중에 들어갔다.
미국이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 바그람기지 탈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8일 영국 방문 일정 중 돌연 바그람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그것을 건설한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국 핵시설에서 바그람기지가 가까워 돌려받겠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중국은 1964년부터 1990년대까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로프노르 사막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1970년대에는 일부 핵시설을 티베트 자치구의 산악 지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람기지는 신장과 티베트에 인접했다. 특히 로프노르 사막의 뤄부포 호수 핵실험장과의 거리는 불과 800여 ㎞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가까운 주한미군 기지에도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현행 임차 방식이 아닌 소유 방식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산공군기지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유사시 재래식 전력인 공격형 드론, 스텔스 전폭기 등을 주축으로 대중·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미군 입장에서는 태평양 내 최대 공군기지인 오산기지를 눈여겨볼 수 있다. 이런 미국의 뜻을 우리가 따를 이유는 당연히 없다. 다만 기지의 현대화 지원 등을 협상 지렛대로 주한미군 분담금 및 역할 조정 등 현안을 풀어내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