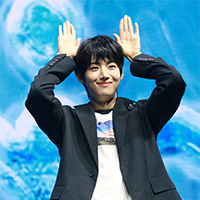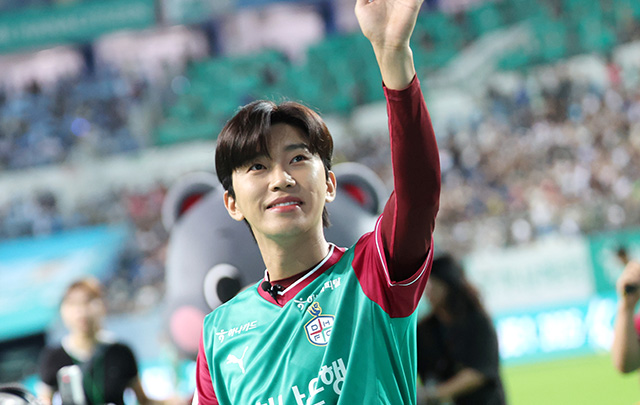순백의 한지 한 점이 공간 전체를 둘렀다. 폭 3m, 길이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종이는 어떤 글도 그림도 새겨지지 않은 채 그저 희다. 작품명은 ‘명명백백(明明白白)’. 4년 전 수십 명의 불자들과 함께 이 한지를 직접 뜬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中峰) 성파(性坡) 대종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백색은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근본이자 바탕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을 품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비어있다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며 “점 하나 찾을 수 없는 종이 위에 모든 것이 꽉 차있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찾아 보라”며 웃었다.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 성파 대종사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4일 청주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개막한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의 특별전으로 열리고 있다. 옛 담뱃잎 보관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단장한 동부창고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는 ‘명명백백’을 중심으로 옻칠과 자개 가루로 완성한 나무 공예 작품 ‘별들의 향연’, 천연 안료를 조합한 옻칠로 한지 위에 형형색색 빛과 색을 입힌 6점의 회화 연작 ‘공(空)에서 색(色)으로’가 함께 자리했다.
비엔날레 개막 10여 일이 지난 현재 성파선예전은 미술품 전시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며 관람객을 모으고 있다. 성파 대종사는 지난 60여 년간 종교적 수행과 예술적 창작이 합일된 삶을 묵묵히 걸었고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미적 체험을 초월해 불교 중심 사상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일종의 법문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 역시 불법을 전하는 고요한 법석(法席)이자 관람객 각자가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의 장으로 세심히 꾸며졌다.
실제 전시는 즐기는 법이 독특한데 관람객들은 신발을 벗고 공간 한복판으로 들어와 앉아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눕거나 눈을 감아도 좋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자작나무로 만든 오브제에 검은 옻칠을 하고 자개 가루를 별처럼 뿌린 ‘별들의 향연’에는 희미한 빛이 떨어진다. 어둠 속 한지가 깨닫기 전의 상태를 뜻하는 무명(無明)이라면 관람객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오브제는 지혜의 빛으로 모습을 드러낸 우주의 단면이자 삼라만상인 셈이다. 또 텅 빈 종이가 색으로 가득한 회화로 연결되는 풍경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공즉시색(空卽是色)’, 즉 현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대종사는 “무(無) 속에 유(有)가 있고 유 속에 무가 있다. 시이무형 청이무성(視而無形 聽而無聲), 형태 없는 것을 봐야 하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지”와 같은 선문답으로 공간을 설명했다.
“원래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나타나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는 중에도 진리는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죠. 이곳이 진리로 향하는 배(船)이자 부처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잘 드러나듯 평생 수행에 매진해 온 대종사는 최근 종교인을 넘어 예술가의 면모까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특별전을 계기로 일반 대중과의 접점도 늘어나는 중이다. 성파 스님은 “승려로 해야 하는 공부와 일을 해나가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옻칠을 해왔는데 그 경험과 시간이 내 안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 이제야 무언가가 되어 밖으로 자꾸 나오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전통 기법과 재료에 대한 관심 아래 도자, 한지, 염색, 옻칠, 회화, 서예, 칠기, 나전 등 다양한 예술과 공예의 영역을 넘나들며 ‘선예일치(禪藝一治)’를 추구해온 오랜 수행의 시간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이 찾아온 셈이다.
성파 대종사는 “내가 취미가 많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한 우물을 옳게 파진 못했는데 대신 오래 살다 보니 연륜이 많아 종합이 잘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지는 몰라도 나 스스로는 완전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2일까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