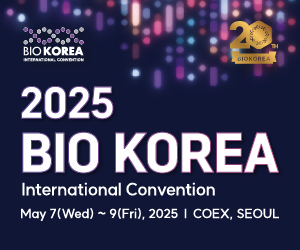‘91.6 대 8.4’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를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점유율을 각각 합한 수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도 현재의 ‘지방소멸’ 양상이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연간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가 열렸고 올해 외국인의 의료 소비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K의료관광이 지금의 기세를 확실히 이어가려면 지역별 특색을 갖춘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 병원들의 활발한 해외 마케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 환자 점유율은 전체의 85.4%로 나머지 지역을 합산해 비교해도 5.84배나 높다. 의료관광객들이 가격과 인프라 면에서 유리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리 잡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은 “서울 강남권은 상급종합병원 4~5곳과 피부과·성형외과 병의원 여러 곳이 공존하고 있어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매우 좋은 조건”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프라와 조건을 갖춘 도시를 찾아보기 드물 정도”라고 말했다. 이성형 루비성형외과 경영대표도 “강남에 있는 병원들은 임상 경험을 워낙 많이 쌓아서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환자들도 그 결과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워낙 심각해 의료관광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의료관광객이 연 3만 명대에 접어들었지만 점유율은 고작 2.6%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유치 외국인 환자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관광자원과 결합하는 등 특성화된 의료관광 전략이 필요하다. 김 협회장은 “단일 지역 차원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휴양과 진료를 결합해 의료관광 상품을 만드는 등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병원들도 적극적으로 지방 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관광 모델 개발, 컨설팅,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의 경우 의료 특화 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통번역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는 몽골 의료관광객을 겨냥해 몽골 국영은행과 공동으로 ‘건강검진 맞춤형 적금’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적금 만기 시 광주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K의료관광의 또 다른 과제는 피부과·성형외과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진료과별 점유율에서 피부과·성형외과 비중을 합하면 68.0%로 70%에 육박했다. 특히 피부과 환자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194.9%나 급증해 70만 5000명에 달했다. 내과통합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나며 점유율을 10.0%로 끌어올렸고 검진센터도 가성비 등이 부각되며 4.5%로 점유율 4위에 올라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김동현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해외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호감도와 수요가 높다”며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를 통해 의료관광객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암 생존율이나 장기이식수술 후 생존율, 세계 상위권인 주요 수술 실력 등 데이터를 조사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한국 의료기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톱 수준”이라며 “국내 기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알리려 많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