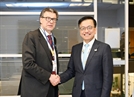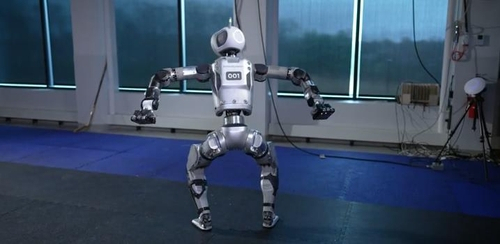당대의 많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폴록은 유명한 수집가 페기 구겐하임의 후원을 받으며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구겐하임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파리로 가서 예술가들과 교류했고 작품을 잔뜩 사들였다. 여러 유파가 난립해 다채롭고도 어지러운 이 시기의 유럽 미술을 구겐하임으로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때 안내자 역할을 한 사람이 마르셀 뒤샹이다. 뒤샹은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구겐하임을 데리고 다녔고 여러 유파의 관계와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구겐하임은 뉴욕으로 돌아왔다. 여러 예술가가 전쟁을 피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구겐하임은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1941년에는 ‘금세기예술갤러리(The Art of This Century Gallery)’를 열어 유럽 전위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미국의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눈길을 돌렸다. 이즈음, 구겐하임의 비서였던 하워드 퍼츨이 폴록의 그림을 구겐하임에게 소개했다. 구겐하임은 질색을 했다. 그런데 몬드리안이 폴록의 그림을 좋게 봐줬기에 구겐하임도 폴록을 다시 보게 됐다.
1942년 6월, 구겐하임이 폴록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화가 리 크래스너와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었던 폴록은 이날 지인의 결혼식에서 들러리 노릇을 하느라 아파트를 비웠다. 폴록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작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식장 근처에서 잠만 퍼 잤다. 크래스너가 폴록을 깨워 겨우 아파트로 끌고 왔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5층까지 올라갔다가 막 내려온 구겐하임은 다시 이들을 따라 5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때까지도 구겐하임은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다음 달 뒤샹이 폴록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림들을 죽 둘러본 뒤샹은 딱 한마디 했다. “Pas mal.” 시원찮게 들리는 이 한 마디가 합격통지서였다.
예술가가 덜 알려진 상태로 있다가 상승하고 명성을 얻게 되는 어떤 계기, 그 계기가 드라마틱하게 응축된 순간을 생각해보는 것은 유익하지는 않지만 흥미롭다. 폴록이 성공 가도에 오른 순간을 고르자면 바로 이 순간일 것이다. 구겐하임은 폴록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다음해에 폴록은 금세기예술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구겐하임의 아파트 벽에 걸 대형 벽화를 제작했다. 폴록은 구겐하임의 지원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를 유명하게 만든 ‘드리핑(dripping)’을 시작했다. 화포를 바닥에 펼쳐놓고 물감을 붓으로 흘리고 뿌리는 작업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뒤샹이 한마디 한 순간보다 폴록이 처음으로 화포에 물감을 흘린 순간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물감을 흘리게 마련이다. 화가의 작업실은 바닥이건 벽이건 뿌리고 흘린 자국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겠다는 생각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흔히 화가들은 캔버스를 벽에 세워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폴록은 화포를 바닥에 펼쳐놓았다. 세로가 가로가 된 것이다. 이런 멋진 생각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다. 폴록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의 예술을 화려한 수사로 꾸미지도 않았다.
반면 폴록보다 앞서 추상미술을 개척했던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촘촘하게 제시했고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거창하게 이야기를 꾸미고는 했다.
1908년 어느 날 칸딘스키의 작업실에 낯선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은 저물녘의 햇빛을 받아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이 무렵 칸딘스키와 함께 지내던 화가 가브리엘레 뮌터가 작업실을 정리하면서 칸딘스키의 그림을 옆으로 세워놓았던 것이다. 칸딘스키는 이때 벼락처럼 깨달음을 얻어 추상화를 그리게 됐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가 했던 또 다른 이야기와 모순된다. 칸딘스키는 1895년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1890~1891)을 보고 뭔지 알 수 없는 형상을 그린 그림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어렴풋이 깨달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의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생각은 예술의 역사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앞서 이뤄졌던 행위와 과정의 귀결이다. 순간은 시간의 거대한 흐름 위에서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는 무수한 거품일 뿐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 거품에 매혹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ong@sedaily.com
skong@sedaily.com